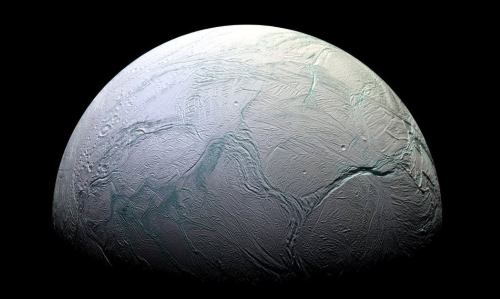이건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가(전 세계가) 어딘가에서 크게 잘못된 길로 빠져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 많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 질문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1990년대의 세계는 그들에겐 경험으로는 거의 알 수 없는, 멀고도 낯선 세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같은 용어들은 알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990년대의 세계가 위선으로 가득했고,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점은 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곧 살펴보겠다. 먼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위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보자. “위선이 가장 악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다른 모든 악 아래에서도 진정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위선 아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범죄와 범죄자만이 우리에게 급진적인 악의 당혹감을 안겨주지만, 진정 썩어빠진 존재는 오직 위선자뿐이다.” (『혁명에 대하여』(On Revolution))
아렌트가 과장했을 수도 있다. 위선은 어떤 사회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위선이 너무 부족하면 사회는 거칠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이 점에서는 아렌트가 옳았다) 사회는 썩게 된다.
그렇다면 1990년대의 허황된 신념(nostrum)들은 무엇이었을까?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좋다.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금융이 확대되면 개인과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금융화는 경제적 평등의 대체재로 여겨졌다. 공부하고 싶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쉽게 돈을 빌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개인은 국가 내에서, 가난한 국가는 세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존 롤스(John Rawls)는 매우 90년대적인 저서 『인민들의 법(The Law of Peoples)』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국가 사회(Society of Nations)’에서 쉽게 돈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썼다. 깊이 있는 금융 부문은 만병통치약이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가 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초래했고, 이는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의 급락을 일으켰으며, 이후 러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도 확산했다. 그리고 2007~08년, 서구에서 규제 없는 금융 자유화와 높은 불평등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이 침체를 일으킨 사람들은 정부가 구제했지만, 피해자들은 방치되었다. 결국 1990년대의 ‘진실’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인종 사회는 좋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엘리트들과 언론은 유럽과 아프리카(에티오피아)의 다인종 공산주의 연방국 해체를 지지했다. 한 지역에서는 다인종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나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 이론은 철저히 노골적인 정치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만 작동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는 자들을 분열시켜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건 설탕으로 코팅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서구 내부에서 다인종 문제가 불거지자, 점점 더 강력한 노동력 이동 장벽이 세워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이다. 유럽은 지중해에서 쾌속정을 배치하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국경에서 1989년에 과시적으로 철거되었던 전기 울타리를 스스로 다시 둘렀다. 다인종 사회를 지지한다고 말했던 그 엘리트들이 정작 다인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쌓았다. 결국 1990년대의 ‘진실’은 틀렸다.
가난한 나라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부유한 나라들과 그 엘리트들이 가난한 나라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가난한 나라는 부패했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논리였다. 기술 이전과 비교우위 원칙의 적용이 바람직했으며, 덜 개발된 나라들의 부패만이 그것들을 막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의 기술 지식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나가자, 이야기는 바뀌었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0년대의 ‘진실’은 틀렸고,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진심으로 믿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문제다.
모든 것은 민간 부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간 부문과 국가가 결합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끌자, 그 주문은 곧바로 바뀌었다. 국가는 산업 정책을 실행하고, 안보 장벽을 세우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1990년대에 믿었던 거의 모든 것들은 틀렸거나,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위선이 지배한 시대에는 대담하거나 대안적인 견해들이 정신이상 취급을 받았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세한 세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사상 경찰이 아니라 지식의 관료들과 성공 요건이 억압했다. 이들은 사유를 질식시켰고, 현실을 왜곡하는 죽은 언어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적어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황폐한 시기였고, 진부한 말들이 인류 사고의 궁극적 성과로 여겨졌다. 오늘날의 세계가 더 나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확실히 지적으로는 더 자유로워졌다.
[출처] Was the world of the 1990s better than today’s?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